
[와이어드 코리아=서정윤 기자] 자율주행차가 100km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물체가 튀어나왔다. LTE(4세대 이동통신) 통신 속도를 기반으로 설계된 자율주행차는 1.4m를 더 간 뒤 제동을 시작하지만, 5G 아래에서는 2.8cm 후면 제동이 시작된다.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경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속도 지연 없는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ICT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연구에 뛰어든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종식 KT융합기술원 상무는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5G 버티컬 서밋 2019’ 행사에서 진행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세션의 연사로 나서 KT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이 상무는 KT 목표가 ‘자율적인 MaaS’(Mobility as a Service)라고 설정했다. MaaS란 기술과 기술을 연결해 끊어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 이 상무는 “안전하고 서비스가 연속적이며, 목적을 가진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세션에선 맥심 플라멘트 5G 자율주행차 협회(5G Automotive Association) 최고기술책임자를 비롯, 문희창 언맨드 솔루션 대표 등 국내외 자율주행차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KT는 지난해 12월부터 ‘5G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모비스 등과 함께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형차를 시작으로 대형차, 버스에 이어 퍼스널 모빌리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초기에는 차량과 도로를 연결하는 통신 시스템(V2I)에 공을 쏟았다. 차량이 도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후 KT는 실제 운전자들의 선호를 연구했다.
이 상무에 따르면 KT는 최근 차량과 교통 인프라를 1~7ms(밀리세컨드, 1ms는 1000분의 1초) 미만의 지연시간을 갖는 5G-V2X(5G Vehicle to Everything) 기술에 공을 쏟고 있다. V2X는 다른 차량과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다른 차량에서 보낸 데이터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KT의 5G-V2X는 기존 V2X를 5G로 연결한 것이다. 차량이 다른 차량, 모바일 기기, 도로 등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서로 교환돼야 하는데, 상대방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데이터도 다른 차량과 주고 받아야 한다.
이 분야에서 KT는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 지난 6월 국내최초로 도로에서 5G-V2X 기술을 실증했다. KT는 5G-V2X를 토대로 내년에 자율주행 전문기업 언맨드솔루션과 함께 세종시에서 관제센터 없이 클라우드 형태로 자율주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속만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상태와 주행·센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 상무는 "우리는 자율주행차가 이루는 세상이 무엇보다 안전하기를 바란다"며 "5G와 다른 기술을 결합해 더 안전하고 나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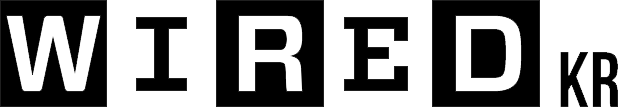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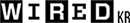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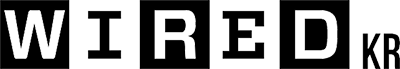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 신청